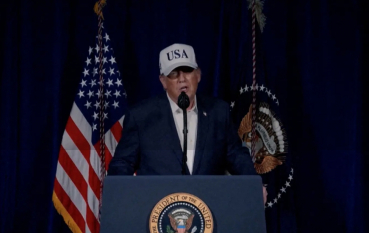지난 25일(현지시간) 아우토슈타트 글로벌 홍보 책임자 리노 산타크루즈 박사는 아우토슈타트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했다.
Like Us on Facebook
산타크루즈 박사는 "황량한 미개발 지역이었던 이곳에 2000년 6월 아우토슈타트가 문을 연 뒤 극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매년 200만명 이상이 찾으며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곳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처음 아우토슈타트 건설 구상을 밝혔을 때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기대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며 "아우토슈타트 방문객의 3분의 1 가량은 자신이 주문한 새차를 받으러 오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고, 방문객의
약 9%는 독일 이외 지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우토슈타트는 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친환경 등 폴크스바겐이 추구하는 가치를 방문객과 공유하는 터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1천500여명 직원의 일터이기도 한 아우토슈타트는 고용 창출 등의 방식으로 하노버-브라운슈바이크-볼프스부르크 등 3개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무형의 큰 효과를 지니고 있는 아우토슈타트에 대해 폴크스바겐 그룹은 1년 운영비의 20∼30%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 뿐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는 하고 있지 않다.
산타크루즈 박사는 "그룹에서 지원받는 돈을 제외한 다른 경비는 아우토슈타트의 입장권 수입, 식음료 판매 매출 등으로
충당된다"고 전했다. 입장권은 성인의 경우 15유로, 어린이와 학생은 6유로 수준이다. 오프 로드 체험, 자동차 타워 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은 별도 요금을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아우토슈타트=폴크스바겐'이라는 인식이 이미 대중들에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이곳을 폴크스바겐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며 "아우토슈타트 안에 폴스바겐을 상징하는 로고를 붙여놓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이 아우토슈타트를 벤치마킹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대기아차가 아우토슈타트를
참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과 독일이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조언을 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테마파크 프로젝트에서는 독창성과 콘텐츠가 중요하다"며 "한국 사정에 맞는 콘텐츠를 발굴해 관람객의 반응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진화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뮌헨에서 만난 폴크스바겐의 제품 홍보 이사 크리스티안 불만도 한국판 아우슈타트인 현대차그룹의 GBC의 성패는 콘텐츠가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불만 이사는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현대차그룹의
결정을 '영리한 행보(smart move)'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땅을 사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회사 주가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래에 어떤 가치를 창출할지 모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14년 전 공장만 썰렁하게 서 있던 볼프스부르크의 황량한 땅에 자동차 테마 공원을
짓겠다고 했을 때에도 '너희가 디즈니가 아닌데 무슨 테마 공원이냐'고 조롱받았다"며 음침하고 음울한 공간을 누구나 신이 나서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유무형의 큰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관건은 테마 파크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있다"며 "12개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는 폴크스바겐과 달리 현대기아차는 브랜드도 2개 뿐이고 역사도 그리 길지 않아
콘텐츠를 뭘로 채울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