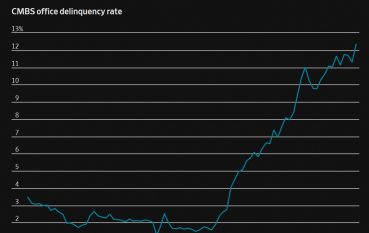블룸버그 조사 75개 기업 부채비율 평균 2.4배→2.7배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섰던 글로벌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기는커녕 부채를 도리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화)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5년간 대규모 M&A를 성사한 75개 기업을 살펴본 결과 인수 후 부채 비율(leverage ratio)을 줄인 기업은 절반에 못 미쳤다.
인수 당시 16개였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대비 부채가 3.5배 이상인 기업도 약 25개로 늘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EBITDA 대비 부채 비율 평균값은 5년 전 2.4배에서 현재 2.7배로 증가했다.
호황기에 대규모 M&A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저렴한 신용에 의존했다가 어려움에 부닥친 대표적인 사례는 제약 유통업체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다.

월그린스는 지난해 11월 헬스케어 업체 서밋 헬스-씨티MD를 약 89억달러(약 11조6천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시너지를 기대했지만, 월그린스는 높은 부채 비율 때문에 이달 들어 무디스에 의해 신용등급이 정크(투기) 등급으로 강등당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로저스커뮤니케이션과 향수 제조사 IFF는 정크 등급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
이들 기업은 고금리와 소비자 수요 감소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부채를 감당하면서 이익 확대와 해외 영업 확장, 비용 절감 등 M&A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투자업체 맨GLG의 스리람 레디 상무는 "이자 비용 상승과 매출 약화로 이자 상환 능력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M&A로 시너지를 발휘하거나 매출 증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인수 대금을 재융자해야 하는 기업에는 심판의 날이 닥칠 수 있다.
또 코로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 쌓은 현금이 고갈되기 시작하고 소비자 지출 감소로 매출이 압박받으며, 경기 침체 위험이 미래 수익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더 높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고려하는 것이 좋은 시기도 아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유에스뱅크가 지난달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CFO의 7%만이 고금리 상황에서 경영 상황 관리에 대해 매우 자신한다고 응답했다.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등 최근 M&A 계약을 맺은 CFO 7명은 여전히 기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워너 브라더스의 프레이저 우드포드 재무 담당 부사장은 "부채 축소와 자금 조달 확대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면서 "우리는 부채를 줄이고 성장할 것이며, 둘 중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발표에서 보듯이 또다른 대형 M&A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