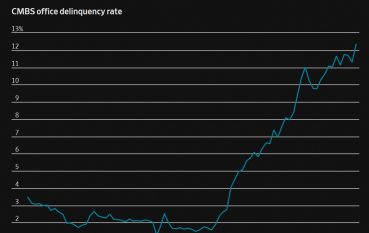토마호크 미사일 등 100발 동원, 후티 60개 군사 목표물 타격
국제사회 양분...유럽 "후티가 빌미 제공", 이란·러 "공습 규탄"
가자지구 휴전 중재 무색해져...이란 '저항의 축 동시 가동' 가능성
미국과 영국이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국제 교역항로 홍해를 위협해온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근거지를 12일(현지시간) 전격 공습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파장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의 상황이 가장 우려했던 확전으로 기울어지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 또는 종료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중동과 이집트, 서아시아 등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영국과 협력해 호주·캐나다·네덜란드·바레인의 지원을 받아 후티 목표물에 대해 합동 공격했다"고 밝혔다.
후티 반군의 레이더 시스템, 대공 방어망, 그리고 단방향 공격용 무인항공시스템과 미사일 저장·발사 시설을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중순 본격화한 후티 반군의 위협에 미국이 다국적 안보 구상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창설한 이후 반군 근거지를 겨냥한 첫 실력행사다.
중부 공군사령관 알렉서스 그린키위치 중장은 16개 지역에 위치한 총 60개 이상의 목표물을 향해 공격이 이뤄졌다며 해군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포함해 100발이 넘는 다양한 유형의 정밀 유도 화력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영국 공군도 타이푼 전투기 4대를 출격시켜 '페이브웨이' 유도 폭탄으로 2개의 후티 목표물을 공격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폭격이 73차례 이뤄져 5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국제사회는 미군 주도 공격을 지지하는 쪽과 예멘 편에서 이를 비판하는 쪽으로 쪼개졌다.
유럽 등 서방은 후티가 홍해상 항해의 자유를 위협하며 이번 공습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미국과 영국은 자기방어 차원의 대응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프랑스는 "후티 반군은 지역적 확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고, 독일은 반군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항로 중 하나에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란에 '대리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란을 위시한 이슬람권 '저항의 축'과 러시아 등 반미 진영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 영국이 예멘 여러 도시에서 저지른 군사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것이 예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명백하게 침해했으며, 국제법과 규칙, 권리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된 선박을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가세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미국과 영국의 공습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가자지구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에 각을 세워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에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을 향해 "홍해를 피의 바다로 바꿔놓으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일 가까이 이어지는 가자지구 전쟁이 홍해 긴장으로 가열돼 중동 전반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종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제동이 걸렸다.
가자지구 주변국 가운데서는 카타르와 이집트 등이 휴전 중재를 이끌어왔는데, 이날 미국과 영국의 공습으로 전쟁이 오히려 지리적으로 확산하면서 협상 분위기가 경직되고 교전도 더 장기화할 것으로보인다.
이날 예멘 반군 폭격을 계기로 가자지구 전쟁에 이란이 개입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엔 한층 더 무게가 실린다.
이란은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 줄곧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최근에는 추모식 폭발 테러의 배후를 미국과 이스라엘로 지목했고, 미·영 공습 하루 전인 11일에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나포하며 중동 지역 제해권을 과시하는 실력행사에 나섰다.
이란이 저항의 축을 '가동'해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 헤즈볼라의 공세 강화,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미사일 발사 등 전면전에 버금가는 동시다발적 무력 행위를 벌일 가능성도 커졌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