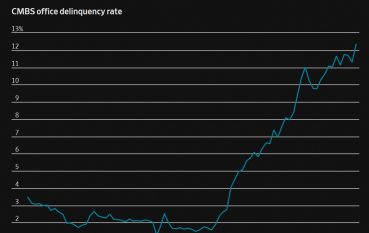2006년 주택 호황기의 상징이었던 이른바 '맥맨션(McMansion)'이 이제는 재정적 부담(liability)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폭스뉴스(FOX)가 12일 보도했다.
FOX에 따르면, 부동산 플랫폼 질로(Zillow)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주택 구매자들은 과거처럼 크기와 화려함을 앞세운 대형 주택 대신, 에너지 효율과 기능성을 갖춘 '고성능 주택(high-efficiency homes)'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료와 재산세가 급등하면서, 설계와 에너지 성능이 최적화되지 않은 대형 주택은 유지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간은 원하지만, 낭비는 싫다"
카테나 홈스(Catena Homes)의 대표 해리슨 폴스키(Harrison Polsky)는 "공간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가치'의 정의가 바뀌었다"며 "가족과 여가를 위한 공간은 원하지만, 목적 없는 과잉 공간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텍사스에서 보험료와 재산세가 상승하면서, 5,000스퀘어피트(약 140평) 이상의 비효율적 주택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단열, 설비, 설계가 우수한 고성능 주택이라면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플로리다도 변화... "회복력(resilience) 필수"
RWB 건설관리(RWB Construction Management) 창립자 로버트 버리지(Robert Burrage) 역시 "플로리다 팜비치 카운티(Palm Beach County)에서도 대형 주택의 매력은 여전하지만, 보험료 급등이 구매 패턴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 지어진 6,000~7,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이라도, 방탄 유리(impact glass), 고지대 설계, 현대식 지붕, 발전기 시스템이 없다면 재정적 위험으로 간주된다"며 "구매자들은 크기를 원하지만, 기후 리스크에 대비된 설계를 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형 '럭셔리'의 기준
질로에 따르면 2006년 럭셔리의 상징이 화강암과 마호가니였다면, 2026년에는 피클볼 코트와 골프 시뮬레이터(관련 매물 언급 25% 증가), 전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40% 증가), 제로에너지 준비 주택(zero-energy-ready homes, 70% 증가)이 새로운 기준으로 떠올랐다.
버리지는 "전 가정용 발전기, 배터리 저장 시스템, 허리케인 등급 설비, 스마트홈 통합, 야외 생활 공간은 이제 기본 사양"이라며 "이런 요소가 없는 대형 주택은 매수자 풀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베이지 박스' 시대의 종말
과거에는 '베이지 톤'을 유지하는 것이 재판매 전략의 정석이었지만, 현재는 올리브 그린과 차콜 그레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컬러 드렌칭(color drenching)' 언급은 149% 증가했다.
폴스키는 "2000년대 중반의 무채색 스펙(spec) 주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을 준다"며 "이제는 깊이 있고 의도된 디자인이 중요하다. 개성 없는 주택은 사진에서 매력이 떨어지고 시장에 오래 머문다"고 말했다.
밀레니얼·X세대가 바꾸는 '럭셔리' 정의
현재 주택 구매의 중심 세력인 밀레니얼과 X세대는 과거의 '크기 중심 럭셔리'를 거부하고 있다. 두 전문가 모두 "럭셔리의 정의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버리지는 "2006년식 대형 주택을 매도하려는 베이비붐 세대는 설비와 인테리어 현대화가 필수"라며 "기후 대응 설계와 낮은 운영 비용을 갖춘 신축 주택과 직접 비교되고 있다"고 말했다.
폴스키 역시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더 의도적이고 기능적인 형태로 진화했다"며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집'이 아니라 '생활을 지원하는 집'이 선택받는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와 세금 상승, 기후 리스크 확대 속에서 미국 주택 시장의 가치 기준이 '크기'에서 '효율과 회복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