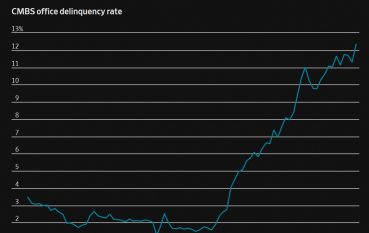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
Like Us on Facebook
2011년 기준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3.4%로 OECD 평균인 5.3%에 훨씬 못 미친다. 이는 9~13%에 달하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저축 안 하기로 유명한 미국(4.2%)보다 낮은 수준이다.
가계저축률은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24.7%로 정점을 찍어, 1990년대 평균 16.1%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가 2001년(4.8%)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밑돌았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저축률은 4.5%로 1년 전 3.4%보다 1.1%포인트 높아졌으나 여전히 OECD 평균치에 못미쳤다. 가계저축률은 2001년 이후 5%를 넘은 경우가 2004년(8.4%)과 2005년(6.5%) 두 차례뿐일 정도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를 통해 수익의 대부분을 유지하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가 본격화한 후 예·적금 유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 신한, 외환, SC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이 최근 예·적금에 붙는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해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렸다.
지난해만 해도 저축의 날에 최고 연 3.4%의 우대금리를 주는 특판 예·적금을 출시하는 은행들이 여럿 있었으나, 올해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저축 외면에는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 부재도 한몫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옛날에는 저축의 날에 특판 상품을 출시할 것을 금융당국이 종용하기도 했으나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며 "당국의 관심은 온통 기술금융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쏠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하원에서 ‘저축증진법’을 통과시키며 노후 대비와 생활 안정을 위한 가계의 저축 장려에 여념이 없는 미국 정부와는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축할 여력이 감소한 것도 저축률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출금리가 워낙 높고 대출 자체가 쉽지 않았던 탓에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전세금과 주택자금을 마련해야만 했다. 이는 가계저축률 상승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축만으로 오르는 주택가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고,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미리 구매해야만 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결국 가계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