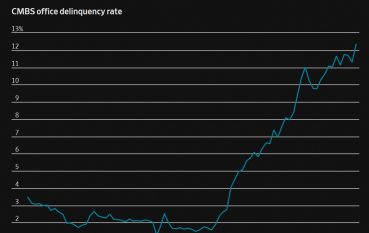15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이 조사한 바로는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641곳이다. (작년 6월 기준). 2004년 분만기관이 1천311개였던 것에 비교하면 49.9%로 10년 새 절반이 줄어든 셈이다. 전년대비 감소율도 2011년 3.84%, 2012년 4.89%, 2013년 5.41%, 작년 8.30%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Like Us on Facebook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곳도 55개로 전체의 23.7%나 차지했다. 2011년 복지부가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한 이후 46개까지 소폭 줄어들었으나 작년 들어 9곳이 더 늘어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전남이 10개 시군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경남(각 9곳), 강원(7곳), 전북·충북(각 6곳), 경기·충남(각 3곳), 부산(2곳) 순이었다.
산부인과의 개업대피 폐업률도 223.3%로 굉장히 높았다. 1곳이 개업할 때 2곳 이상이 문을 닫는 셈이다. 또한, 산부인과 간판을 걸고도 산모를 받지 않고 피부과 등 다른 과목의 진료를 하는 경우도 많다. 산부인과 남자의사 비율이 낮아지며 군 복무 대체로 공중보건의를 하는 사람도 줄어들어 지방의 경우 좋은 분만시설을 찾는 것은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다.
그렇다면 산부인과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신생아 수의 감소다. 출생아 수와 조출생률, 합계출산율은 2013년 이후로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출생아 수는 43만 6천500명으로 전년대비 9.9%(4만 8천100명)이나 감소했으며, 조출생률 (인구 1명당 출생아 수) 역시 8.6명으로 1970년 이래 가장 낮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3년의 1.187명보다 0.11명으로 줄어 '초저출산' 기준선인 1.30보다 내려갔다.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71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OECD 34개국 중 가장 낮다. 인구가 장기가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 대체 수준 합계출산율'(2.1명)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반면 고령 인구 비율 노령화 지수 (0~14세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2013년 83.3으로 2003년 41.3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된다면 2017년엔 104.1을 기록해 유소년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경제의 '암초'와 같다. 올해 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3천6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3.0%다. 인구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비중이지만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저출산이 계속될 시 2060년에는 실질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등 복지분야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 지난해 19.7%에서 2060년엔 32.5%로 폭증하게 된다. 수십 년 내 국민연금은 고갈될 것이며 국가재정까지 파산될 수 있다. 돈 버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니 재정도 견딜 수 없다. 고령화는 모든 선진국이 거쳐 가는 과정이지만, 한국의 저출산은 유례없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006년부터 1·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 본 계획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등 정부 대책의 효과마저 미미하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인구 보건학적 측면에서 현재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2005년에 잠시 공론화됐던 이민정책을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지점까지 왔다."라며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게 하려면 여성복지 정책은 물론 분만 인프라 확충 등 기본적인 부분에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