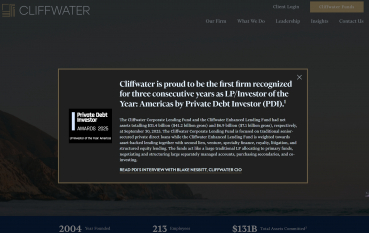약 한 달 동안 주춤하면서 한풀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달러화 강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6월 조기 인상 전망이 가라앉으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모건스탠리와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로 일한 스테픈 젠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인용, 달러화 강세가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화 강세가 경제성장 같은 순환적 요인들 때문에서만 비롯된 게 아니라 달러화 채무 상환 수요와 중앙은행들의 달러화 비중 확대 수요가 겹친 것이라, 이 요인들이 달러화 강세를 장기간 이끌 것이라는 것.
그는 우선 미국 이외 국가들과 기업들이 현재 지닌 미 달러화 채무가 사상 최대인 9조 달러에 달하고 이들 채무 대부분이 앞으로 수년 내 상환 기일을 맞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달러화가 오른 상황에서 채무자들은 빚을 조기 상환하거나 적극적인 헤지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거대한 달러화 수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 중 달러화 비중이 10년 전 73%에서 2011년 사상 최저인 60%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조금 올라 현재 63%이지만 앞으로 달러화 비중 확대 추세가 계속돼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그러면서 달러화가 앞으로 3개월 내 패러티(1달러=1유로)를 넘어 유로당 96센트로 역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ING의 수석외환전략가 크리스 터너는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로 마이너스 수익률에 진입한 유로존 국채들이 향후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마이너스 또는 매우 낮은 수익률에 형성된 유로존 국채들이 중앙은행들의 달러화 비중 확대 추세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2개 주요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달러화 강세가 향후 6∼12개월에서 수년 동안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고, 달러 가치가 고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시각은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야누스 캐피털로 자리를 옮긴 '채권 왕' 빌 그로스는 미국과 유럽의 금리 격차는 결국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화 강세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