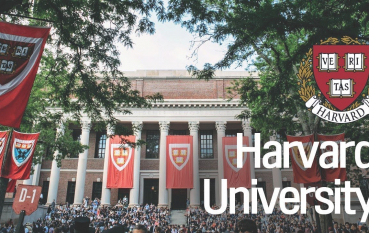BCG, 세미콘 코리아서 '미국 투자 환경과 시장 전망' 발표
美 기업들, 현지조달 방안 모색..."관세 25% 부과는 압박용"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며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한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2025.2.14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김창욱 보스턴컨설팅(BCG)그룹 매니징디렉터(MD) 파트너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미국 투자 환경과 시장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미국 내 투자가 늘고 관세 확대 가능성 등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인력 및 부품) 현지 조달을 위한 새 협력업체를 찾고 있다"며 "한국 소부장 업체에는 기회"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중요해진 데다, 반도체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기회 요인으로 꼽았다.
김 파트너는 "인텔 등 대형 종합반도체회사(IDM)가 아닌 규모가 작은 IDM을 만나보니 미 정부 지원이 대형 업체들에 집중돼있고, 여러 소부장 업체도 이들에게 몰린다고 토로한다"며 "거기다 중소형 IDM이 생산능력을 확대함에 따라 인력 확충도 필요한데 한국 소부장 업체들이 도와주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새로운 협력 업체들을 찾고 있어 한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 회사와 협업하면 경험과 연구개발(R&D) 역량 강해지는 윈윈 효과도 얻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제조기업 외에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의 미국 진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봤다.
김 파트너는 "지난해 7월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합의가 있었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통과되지 못한 팹리스 등을 지원하는 '반도체 기술 진보와 연구법'(STAR Act)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설계자산(IP), 디자인을 포함한 팹리스의 미국 진출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 폐기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파트너는 "한국 기업들로부터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칩스법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면서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기존 법안을 취소시키려는 데는 큰 노력과 우려가 야기되기 때문에 쉽게 취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주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어 개정은 있겠지만 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입법된 칩스법에 대해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파트너는 "칩스법으로 미국 내에 3천9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일으켰고 11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 그동안 반도체 팹(공장)이 없었던 곳에서도 공장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라고 짚었다.
BCG그룹에 따르면 칩스법 시행 후 대만 TSMC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 삼성전자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SK하이닉스 인디애나주 공장, 글로벌파운드리 뉴욕주·버몬트주 공장 등 10여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생겨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파트너는 연합뉴스와 만나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할 수도 있지만, 하더라도 유예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며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를 매기는 것과는 달리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에 관세가 붙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이를 사용하는 애플과 같은 미국 업체들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는 한국 기업에 투자를 더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으로 관세 카드를 쓸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