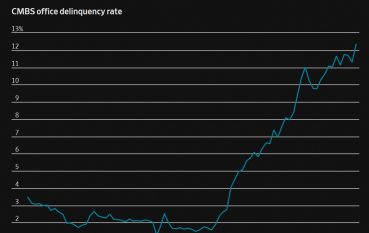미국에서 우편 주문 약국들이 메디케어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처방약을 반복 배송하면서, 최근 3년간 환자와 정부에 약 30억 달러(약 4조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메디케어 처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하루 한 알'인데 1년 치가 남았다
WSJ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의 약국 사업부는 메디케어 수급자인 빌 질린스키(74)에게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스타틴을 반복적으로 조기 배송했다. 그는 의사 지시에 따라 하루 한 알씩 복용했지만, 남은 약만으로도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양이 쌓였다.
전직 미 공중보건 차관보를 지낸 약사 파멜라 슈바이처는 "엄청난 낭비"라며 "복용하지도 않는 약을 집에 쌓아두는 것은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9%가 37%를 차지한 우편약국
WSJ 분석에 따르면 2021~2023년 동안 우편약국은 전체 메디케어 처방의 9%만 담당했지만, '과잉 조제' 비용의 37%를 차지했다. 이들 약국은 90일치 처방을 자동 갱신으로 조기에 배송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규제가 완화되면서 조기 리필 관행은 더욱 늘어났다. WSJ는 '초과 조제'를 최대 3년간의 처방 내역 중 한 달치 이상을 초과한 경우로 정의했다.
위험 약물도 예외 아냐
과잉 공급된 약에는 근육 이완제와 항정신병 약물도 포함됐다. 약사들은 이런 약물이 과다 복용이나 오복용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유나이티드헬스의 옵텀(Optum) 약국은 근육 이완제 티자니딘 90일치 처방의 30% 이상을 이전 배송 후 68일이 지나기 전에 발송했다. 이는 전체 메디케어 약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메디케어 당국은 "조기 리필은 안전성과 제도 건전성 측면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신호"라고 밝혔다.
'약을 더 보내면 돈이 된다'
대형 우편약국들은 건강보험사를 소유한 기업 집단 산하에 있다. 유나이티드헬스, Humana, CVS Health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구조에서는 보험사가 자기 계열 약국에 약값을 지불하면서, 규제가 강한 보험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약국 부문으로 수익이 이동한다.
WSJ 분석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헬스는 메디케어 수급자 1인당 평균 142달러의 '초과 약값'을 발생시켜 주요 사업자 중 가장 높았다. 휴마나는 90달러로 뒤를 이었다.
현장의 혼란
뉴욕의 가정 방문 의사 조 멀베힐은 "노인 환자 집에 가면 서랍이나 신발 상자에 약병이 가득 쌓여 있다"며 "약이 많을수록 어떤 약을 먹는지 혼란스러워진다"고 말했다.
텍사스의 영업사원 대니얼 더피(55)는 Express Scripts를 통해 항우울제를 받다가 매번 15알씩 남는 상황이 반복되자 우편 리필을 중단하고 동네 약국으로 옮겼다.
기업들 "환자 안전 위한 것"
유나이티드헬스는 "약 부족으로 환자가 중증 질환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큰 위험"이라며, 조기 배송은 환자가 이후 리필을 거부할 수 있어 '낭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휴마나 역시 "복약 순응도와 재고 과잉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WSJ 분석은 2021~2023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들은 2024년 이후 조기 리필 차단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남는 약의 또 다른 문제
과잉 처방 약을 폐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부 비영리 단체는 사용되지 않은 밀봉 약을 기부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지만, 매달 수백 병이 쌓인다.
WSJ는 2021~2023년 사이 사망한 메디케어 수급자들이 남긴 '초과 약값'이 1인당 평균 240달러에 달했으며, 유나이티드헬스 이용자는 평균 357달러로 더 높았다고 전했다.
편의성과 복약 순응도를 명분으로 한 자동 리필이 고령자 가정에 불필요한 약을 쌓이게 만들고, 막대한 공공 재정 낭비와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조기 리필 기준 강화와 환자 통제권 확대 없이는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