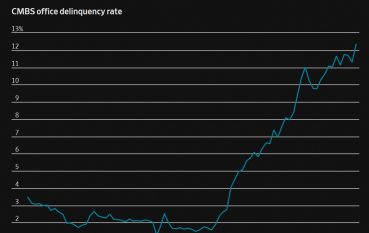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동통신 3사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대폭 줄이고 영업이익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이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입법 취지와 거리가 있는 대목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천261원이었지만 2015년 22만2천733원, 올해 6월에는 17만4천205원으로 40.6% 감소했다.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통신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천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천358원으로 46.9% 줄었고, LG유플러스가 29만9천413원→19만5천794원으로 41.4%, KT가 28만9천959원→16만9천839원으로 34.6% 감소했다.
여기서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과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15%),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으로 이통 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014년에는 2천49만 명, 2015년에는 2천145만명이었다. 1인당 지원금을 전체 이용자 수와 곱하면 이동통신 3사가 줄인 지원금은 2015년 한 해에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감소했고, 관련 마케팅비가 줄면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1천688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천581억원(96.7%) 급증했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렸다"며 "분리공시 등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지원금 규모 감소가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직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었고, 그 결과 통신사들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 가격과 요금제가 비쌀수록 지원금보다는 선택약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지원금 규모 감소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이익은 비용으로 잡히던 지원금 외에 명예퇴직 등으로 인건비가 줄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선택약정은 할인분이 매출에 반영되기 때문에 통신사 매출에는 오히려 부담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