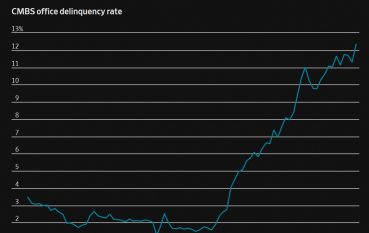경기침체의 전조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미국 국채금리의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화) 최근 국채금리 역전 현상을 경기침체의 예고가 아닌 인플레이션 완화에따른 금리인하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은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는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 만기가 장기 채권의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채권의 기간이 길 수록 예기치 않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우려 커지면 단기 채권이 상당한 위험부담으로 수요가 감소해 금리가 상승하지만, 이에 비해 장기채권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로 인해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기존의 해석이었다.
지난 23일 미국 채권시장에선 4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의 장·단기물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경기 둔화 우려에 장기물 국채 수요가 몰리면서 3.8% 아래에서 마감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4.52%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다.

역사적으로 볼때,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난 후에 예외없이 경기침체가 왔다. 그러기에 금리역전현상은 경기침체의 전조현상이라고 받아드려진다.
다만 최근에 발생한 장·단기 채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오히려 연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힌 후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때문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다.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내후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2년물 국채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10년물 국채금리를 낮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