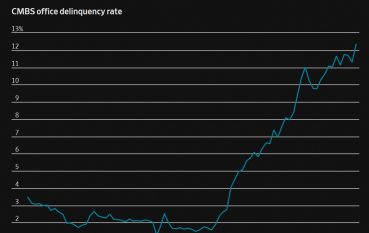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나만의 진로를 찾고 싶어 하면서도 대학에 갈 생각은 없는 이들을 위한 현명한 길이죠."
지난해 가을 미국의 한 직업훈련학교에서 9개월 과정의 용접 수업을 수료한 태너 버제스(20)는 고등학교 졸업 후 또래와는 사뭇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캠퍼스 대신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병원으로 출근해 용접과 배관 설치를 돕는다.
대학 졸업장은 못 받게 됐지만 후회는 없다고 했다. 일반 사무직보다 현장에서 뛰는 게 적성에도 맞고, 약 5년 뒤에는 1억원대 연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버제스는 말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Z세대는 어떻게 '공구 벨트'(각종 공구를 매달 수 있게 만든 허리띠) 세대가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요즘 미국에서 버제스처럼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치솟아 부담이 커진 데 비해 졸업장이 주는 효용 가치는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미국에서 직업 훈련 칼리지에 등록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해 2018년 교육 분야 비영리 단체 NSC가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과 차량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배우는 학생도 각각 23%, 7% 늘었다.
용접이나 배관 등 업무가 높은 수익을 안겨주면서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건설직 신규 직원의 임금은 전년 대비 5.1% 오른 4만8천89달러(약 6천500만 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분야 종사자 임금 인상률은 2.7%로 3만9천520달러(약 5천300만 원)에 그쳤다.
건설직 신입사원의 연봉 중간값이 회계사, 정보기술(IT) 유지보수 업계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4년째라고 급여 분석업체 ADP는 설명했다.
위스콘신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상담 업무를 맡은 스티브 슈나이더는 "여전히 4년제 대학이 최고의 표준이라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다른 길의 가능성을 알게 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