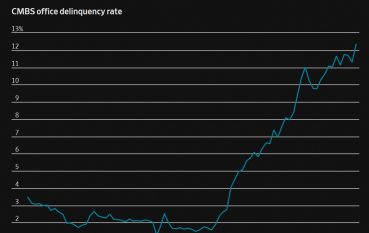경기 '적신호'가 아닌데도 금리 인하... 그가 세 번째로 택한 위험한 도박
연준(Fed)이 수요일(17일)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통화정책처럼 보였다. 시장의 반응은 차분했고, 사상 초유의 정치적 대치 속에서도 의사결정에 반대 의견이 크게 표출되지는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인하로 시작된 방향 전환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과 더 맞는 인사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갖기 전에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복잡한 상충 요인 속에서도 경제를 운용할 수 있음을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입증하려는 '최후의 방어선'일 수 있다고 WSJ가 보도했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내년 봄에 끝난다.

WSJ에 따르면, 파월은 재임 중 세 번째로 '침체가 임박해서가 아니라 침체를 막기 위해' 선제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 2019년의 시도는 팬데믹으로 평가가 불가능해졌고, 지난해엔 고용시장이 진정됐지만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관세 인상 영향으로 보이는 물가 하락 정체가 나타났다.
이번 선택은 더 위험하다. 연준은 전통적 독립성에 대한 이례적 도전, 둔화되는 성장, 끈질긴 인플레이션-이전 두 차례보다 더 까다로운 복합 과제를 동시에 헤쳐 나가야 한다.
역사는 파월의 이번 도박에 대해 세 가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
1990년대 중반처럼 금리 인상 기조를 되돌려 연착륙을 이룰 수 있다.
-
1967년처럼 성급한 인하가 1970년대의 지속적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
1990·2001·2007년처럼 인하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연준이 수요일에 내놓은 성장·물가·고용 전망은 6월과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6월에는 근소한 다수가 연내 두 차례 인하를 그려 넣었다면, 이번에는 세 차례(이번 주 인하 포함)를 전망한 위원이 근소하게 많았다. 이는 10월·12월 연속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다.
이유는 여름 동안 고용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7주 전 동결을 결정할 당시엔 고용시장이 건실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수정치 반영으로 3개월 평균 고용증가가 6월 발표치(15만 명)에서 8월 기준 2.9만 명으로 낮아졌다. 파월은 "하방 위험이 의미 있게 존재한다"고 말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이번에 0.5%p 인하 같은 더 공격적 조치가 필요했다고 본다. 로스앤젤레스 자산운용사 페이든&라이겔의 제프리 클리블랜드는 "고용 증가가 지금처럼 둔화한 뒤 경기침체 없이 재가속한 사례는 드물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관세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위험에만 치우쳐, 제조업 등 기업의 채용 위축과 같은 성장 훼손 위험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이들은 연준이 구조적 변화를 일시적 경기 사이클로 오독할 위험을 우려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노동공급 축소)과 광범위한 관세 인상 같은 정책 실험은 경제의 잠재 성장 능력 자체를 바꾸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금리를 과도하게 내리면, 수년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소비·기업이 가격 인상에 익숙해져 높은 물가가 고착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전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총괄 이선 해리스는 "경제학자들이 연준이 물가를 낮출 것이라 확신한다고 해서 대중도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균적인 미국인은 인플레이션을 여전히 크게 우려한다. 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난 대선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요컨대, 파월은 경기의 미묘한 균형과 정치의 거센 파고를 동시에 헤치며 선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도박이 연착륙을 재현할지, 물가 재가열을 부를지, 아니면 침체 회피에 실패할지는-다가올 몇 차례의 고용지표와 연준 회의에서 가늠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