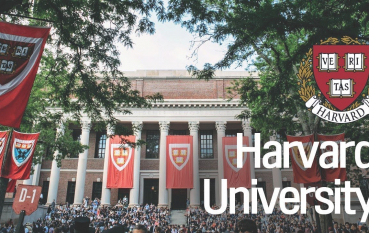미국, 베트남 경유 중국산 제품에 40% 관세...중국의 우회통로 원천 봉쇄 노려
미국과 베트남 간 새로운 관세 합의는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이른바 '우회수출(backdoor route)'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한 이번 협정의 핵심 조항에 따르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재수출(transshipped) 제품에는 40%의 징벌적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베트남산 제품에 적용되는 20% 관세의 두 배에 해당한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서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우회수출로 간주될지, 이를 어떻게 단속·검증할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베트남 합의는 미국이 최근 전 세계 무역 재편 과정에서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중국 견제를 잘 보여준다. 중국과의 불안정한 관세 휴전 이후에도, 미국은 다른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꾸준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정에서도 공급망 보안 강화를 요구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했다. HSBC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프레데릭 노이만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이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사실상 틀어막으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무역 협상과 합의는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베트남은 트럼프 1기 시절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부상했다. 하노이, 호찌민 등지에 신규 공장이 속속 들어서면서 중국과 서방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됐다.
나이키,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발표한 이후 이들 기업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베트남 현지에서 유아용 가구를 생산·수출하는 미셸 베르츠 씨는 "20%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여전히 베트남이 제조업 기지로서 매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산 제품에는 평균 40~50%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20% 수준이라도 베트남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일본이나 독일보다 적었고, 중국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역적자는 1,2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나며 중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커졌다.
미국은 베트남이 중국산 제품의 단순 경유지로 전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은 올해 1~5월 기준 전년 대비 10%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베트남의 대중(對中) 수입은 28% 증가했고, 대미 수출도 26% 늘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IN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리서치 책임자인 디팔리 바르가바는 "기계류, 전기·전자 부품, 전선·케이블 등 분야에서 강력한 환적(transshipment) 신호가 포착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도 원산지 증명서 검증을 강화하며 중국산 우회수출 차단에 나섰다. 원산지 증명서는 제품 및 부품의 제조국을 상세히 기재해 적정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의류, 가구, 전자제품 등 다양한 베트남산 제품이 여전히 중국산 부품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어떤 제품에 20% 관세를, 어떤 제품에 40% 관세를 부과할지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영국계 경제분석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와 가레스 레더는 "이러한 합의 조항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중국 외부에서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