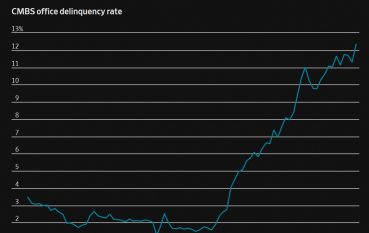며칠 전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 된 이후, 캘리포니아에 사는 김지영(46세)씨는 아들의 2015년 대학 입학을 앞두고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김씨 아들은 학비가 비교적 저렴한 대학, UC계열 학교 그리고 타주 사립대학까지 합격했다. 그런데 아들이 택한 곳은 장학금 혜택이 가장 적은 타주 사립대학. 그 학교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 김씨는 5만 불의 학비를 추가로 더 감당해야만 한다. 정부 보조도 기대할 수 없는 중산층의 김씨 가족은 아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지 망설이고 있다.
중산층 가정에 자녀 4명을 대학 보낸 어바인에 사는 정씨는 "아이비 리그 혹은 의대가 아니면 졸업해서도 특별한 것 없는 요즘 시대다. 아들에게 정확한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학자금 대출을 자녀 본인 이름으로 받고 스스로 책임 질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녀 이름으로 나오는 론은 일년에 고작해야 5,000불에서 7,000불 사이이다. 그 이외의 융자는 모두 부모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공식적으로 자녀의 책임이 아닌 부모 책임인 것이다. 아이가 졸업을 해서 부모의 융자를 갚아 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오랜 기간 빛을 앉고 갚아 나가야만 한다.
전문가들은 학교 진학 및 등록금과 관련해 자녀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선택한 전공으로 졸업을 할 경우 연봉은 얼마인지, 원금에 이자까지 10년 안에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