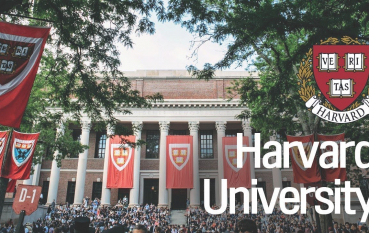중국과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으며, 각국 지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주요 교역국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이탈리아산 커피, 일본산 위스키, 아시아산 스포츠웨어 등 다양한 상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
특히 중국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5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즉각 반발하며 미국에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무역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보호무역주의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도 "가장 오랜 동맹국에게 배신당했다"며 EU가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수백만 명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떠날 예정이다.
한편,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고 칭한 이날 발표 직후 각국에 즉각적인 보복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CNN 인터뷰에서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깊이 생각하고,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복이 이뤄지면 무역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 여지 남아... 그러나 시장 불안 가중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0% 기본 관세는 6일 0시부터 발효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개별 품목별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어, 최종 관세율이 발표된 수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향후 24시간 동안 시장은 이러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협상의 출발점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포스터 보드에 공개한 관세율을 '비논리적이며 터무니없다'고 혹평했다.
동맹국들도 강력 반발... "이것이 우방의 행동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주요 교역국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우리는 미국과 오랜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결코 우방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며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관세 조치는 양국 관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도 2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자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 신중하지만 과감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평균 관세율 기록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이 22.5%로 상승하게 되며, 이는 지난 10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평균 관세율은 2.5%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 조치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 개방을 유도할 것"이라며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가 바로잡으려는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남아 공급망도 타격... 의류·소비재 가격 급등 우려
미국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해왔지만, 이번 관세 조치로 이들 국가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46%), 캄보디아(49%), 태국(36%)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발표하며 이들 국가가 중국을 대신할 '우회 생산지'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의류·소비재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