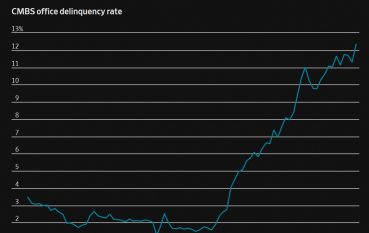계획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야심차다. 하지만 과연 성공할까?
중간선거까지 불과 19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건 물가 상승이나 무역전쟁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세 정책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적 충동이 아니다고 폭스뉴스(FOX)가 오피니언을 올렸다.
탄비 라트나는 FOX오피니언 칼럼에서 이는 훨씬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이 정책은 미국의 부채 문제를 관리하고, 산업 기반을 재편하며, 글로벌 질서 속 미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고위험 시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대다수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한 가지 문제에서 시작된다.

2025년, 미국 정부는 만기 도래하는 9.2조 달러의 부채를 다시 조달해야 한다. 이 중 약 6.5조 달러는 6월까지 상환해야 한다.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대륙 규모에 맞먹는 '부채의 벽'이다.
여기서 수학이 등장한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에 따르면, 금리가 1bp(0.01%) 하락할 때마다 미국 정부는 연간 약 1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2%에서 3.9%로 30bp 하락했다.
만약 이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연간 300억 달러의 이자 비용이 절약되는 셈이다.
따라서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재정적인 생존 문제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연준(Fed)**은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다면, 연준의 도움 없이 금리를 낮출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서부터 전략이 흥미로워진다.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행정부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런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리스크 자산(주식 등)**에서 빠져나와 **안전 자산(미국 국채 등)**으로 몰리게 만든다.
이번 주식시장 폭락처럼 말이다. 수요가 늘어나면 국채 수익률(금리)은 자연히 떨어진다.
이 전략은 직관에 반하는(move) 방식이지만, 계산된 전략이다.
일부는 이를 **"과열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디톡스(detox)"**라고 부른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효과가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저렴한 차입비용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적자는 여전히 막대하며, 이제는 지출 삭감이 필요하다.
**정부 효율성부(DOGE)**와 일론 머스크의 지원을 받은 이 행정부는, 하루 4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의 권고가 실제 삭감으로 이어지고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2025년 말까지 1조 달러 규모의 적자 감축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첫 두 가지 축이다:
- 차입 비용 감소,
- 재정 지출 축소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축이 남아 있다: 성장(Growth).
관세는 이 성장 전략의 점화 장치 역할을 한다. 수입품 가격을 높임으로써, 미국 국내 생산자들이 다시 시장에 진입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전략의 목적은 무역 파트너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산업이 재건될 수 있는 "숨 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그 대가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고통을 앞당겨서 겪고,
2026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눈에 띄는 일자리 증가와 공장 가동 성과를 내겠다는 계산이다.
그 사이, 관세 자체도 연간 약 7,000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금 감면, 사회보장제도, 의료보장(Medicaid) 등의 유지에 필요한 재정 여유를 만들어 준다.
이 전략은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 지정학적 재편과 함께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조용히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거리를 두고, 유럽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걸프 국가 및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도 다시 열고 있다.
왜일까?
냉전 이후 형성된 무역 질서는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체제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외 아웃소싱, 전략적 의존성을 키웠다.
이제, 관세가 협상의 지렛대로 쓰인다.
미국과 이해관계를 맞춘 국가에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국가에는 비용을 부과하는 식이다.
중국은 당연히 중심에 있다.
수년간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인위적으로 낮은 환율과 산업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해왔다.
관세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위안화 평가절하 문제에 대한 재조정을 압박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한 조건 협상을 요구받을 수 있고,
인도는 자국 관세 인하 압박,
캐나다와 멕시코는 펜타닐 문제 및 국경 단속 문제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것은 무작위적인 조치가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전략이다.
무역정책을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논리는 명확하다.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철강, 자동차, 섬유-는 경합주(스윙스테이트)에 집중되어 있다.
행정부는 이들 지역에서의 '가시적인 성과'가,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는 산업에서의 단기적 고통보다 더 큰 정치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위험은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거나, 리쇼어링(제조업의 국내 복귀) 전략이 실패한다면, 그 반작용은 클 수 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철저히 의도된 '체계적 혼란(disruption by design)'이다.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장 야심찬 재정 및 산업 재편 시도 중 하나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과연 이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